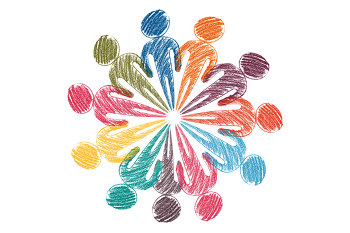사랑방/아, 그 말이 그렇구나(성기지)
모도리와 텡쇠
한글문화연대
2020. 7. 22. 10:33
[아, 그 말이 그렇구나-344] 성기지 운영위원
사람의 생김새나 어떤 일 처리가 빈틈이 없이 단단하고 굳셀 때, ‘야무지다’, ‘야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빈틈없이 매우 야무진 사람을 나타내는 우리 토박이말이 ‘모도리’이다. 흔히 겉과 속이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을 ‘차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차돌은 모도리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차돌은 생김새가 단단한 사람을, 모도리는 일처리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을 주로 일컫는 말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차돌이나 모도리와는 반대로, 겉으로는 무척 튼튼해 보이는데 속은 허약한 사람을 낮잡아서 우리 선조들은 ‘텡쇠’라 불렀다. 텡쇠는 아마도 ‘텅 빈 쇠’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하고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 현대문명에서 ‘텅 빈 쇠’ 하면 곧바로 깡통이 떠오른다. 하지만 깡통은 머리가 텅 빈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텡쇠와는 다르다. 텡쇠와 깡통은 둘 다 낮춤말이지만, 우리 정서에는 깡통이 훨씬 부정적으로 들린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모도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찌 모도리만이 필요할까? 겉모습은 단단하지만 속이 허약한 텡쇠도, 머리가 텅 빈 깡통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사회의 귀한 구성원이다. 가냘프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생이’도 제 할 몫이 따로 있는 구성원이고, 어찌 보면 염치가 없이 막되거나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만무방’도 필요한 것이 사회라는 오묘한 울안이다.